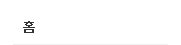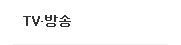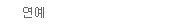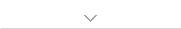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말려도, 유서 쓰며 국회 달려가… 그날 잊으면 미래 민주주의 없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은 같았다. 동아일보는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건 “계엄을 막은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나온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의 염원이 잊혀지면 다음 위기에서는 민주주의가 버티지 못한다”는 경고였다.● “뛰는 길에 유서 써” “가족 만류에도 ‘지키러’”오후 10시 27분, 강영수 노무사(33)는 형에게서 걸려 온 전화로 잠에서 깼다. “계엄 했다는데….”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뛰어나와 국회로 향하는 30분 동안 그는 카카오톡에 짧은 유서를 남겼다. ‘겁난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그냥 움직이고 있다.’ 네 아이를 둔 오수정 씨(49)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신발을 구겨 신는데 중학생인 막내딸이 다리에 매달렸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은 같았다. 동아일보는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건 “계엄을 막은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나온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의 염원이 잊혀지면 다음 위기에서는 민주주의가 버티지 못한다”는 경고였다.● “뛰는 길에 유서 써” “가족 만류에도 ‘지키러’”오후 10시 27분, 강영수 노무사(33)는 형에게서 걸려 온 전화로 잠에서 깼다. “계엄 했다는데….”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뛰어나와 국회로 향하는 30분 동안 그는 카카오톡에 짧은 유서를 남겼다. ‘겁난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그냥 움직이고 있다.’ 네 아이를 둔 오수정 씨(49)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신발을 구겨 신는데 중학생인 막내딸이 다리에 매달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