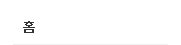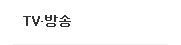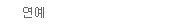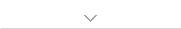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카페는 세트장, 난 바리스타 연기자" 8년간 살아남은 이 카페의 비결
모두가 서울로 향할 때, 자신의 고향 충남 공주로 돌아온 청년이 있었다. 원도심 한가운데 터를 잡고, 커피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을 시작했다.
진한 커피 향 가득한 작은 공간. 한쪽에는 노트북을 켠 학생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담소를 나눈다. 관공서나 작은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들은 열띤 회의 중이다. 이들은 카페를 드나들며 스스럼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작당 모의로 하나가 된다.
'반죽동247'이라는 카페 이름은 행정구역상의 주소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24시간 × 7일 = 항상'이라는 은유를 담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지속 가능한 관계를 뜻한다. 카페란 무엇일까.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파는 공간일까. 황순형 사장의 해답을 들어보았다.
영화 만들고 싶어 글만 쓰던 소년
중학생 시절, 그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 방법을 몰라 글만 열심히 썼다. 글짓기 대회가 있으면 꼭 참가했고, 심지어 공주교대 국어과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자신의 글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때 쓴 문집은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드라마 제작을 바로 전공하기보다는 기초가 될 영화학의 길을 찾고 싶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는 공주 출신 선배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진로 상담을 위해 알지도 못하는 선배를 찾아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선배와의 만남 후, 결심이 선 그는 매주 서울을 오가며 영화 입시학원을 다녔다. 토요일 2교시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두 타임 수업을 듣고 숙소에서 잠을 잔 뒤, 일요일 두 타임 듣고 공주로 내려오는 생활을 1년 동안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이 넓음을 깨달았다. 보수적인 도시인 공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
대학에 들어간 그는 나름 '꽤 잘하는 학생'이었다. 학교 워크숍 작품, 선배들의 졸업 작품, 각종 독립 영화들에 스태프로 참여하며 20대 초반을 보냈다. 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후 상황이 달라졌다.
"내가 열심히 알려주고 도와주던 후배들이 저보다 더 많이 성장해 있는 걸 느꼈어요. 엄밀히 말해 그때 깨달은 것은 영화 현장에서의 제 위치였죠. 봉준호나 박찬욱 같은 이들만 예술을 하고, 저 같은 스태프들은 노동을 하는 셈이었죠."
그에게 영화는 '약속'이었다. 약속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약속된 콘티를 짜서,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사람들이, 약속된 시간에 만나서, 약속된 것들을 주고받는 행위였다. 완벽한 컷을 추구했다가 망친 경험도 있었다.
"어떤 신(scene)을 준비해 촬영하는데, 갑자기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한 컷 정도만 원래 콘티와 다르게 더 예쁘게 만들자고 고집을 부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샷만 예쁘게 나오고, 그 샷 하나 때문에 앞뒤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1천만 원으로 시작한 무모한 실험
영화에만 빠져 살던 그가 카페를 하겠다고 마음먹게 만든 계기는 어머니였다. 2015년 지금의 '반죽동247'의 전신인 '반죽동 커피공방'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체 내용보기
진한 커피 향 가득한 작은 공간. 한쪽에는 노트북을 켠 학생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담소를 나눈다. 관공서나 작은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들은 열띤 회의 중이다. 이들은 카페를 드나들며 스스럼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작당 모의로 하나가 된다.
'반죽동247'이라는 카페 이름은 행정구역상의 주소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24시간 × 7일 = 항상'이라는 은유를 담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지속 가능한 관계를 뜻한다. 카페란 무엇일까.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파는 공간일까. 황순형 사장의 해답을 들어보았다.
영화 만들고 싶어 글만 쓰던 소년
중학생 시절, 그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 방법을 몰라 글만 열심히 썼다. 글짓기 대회가 있으면 꼭 참가했고, 심지어 공주교대 국어과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자신의 글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때 쓴 문집은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드라마 제작을 바로 전공하기보다는 기초가 될 영화학의 길을 찾고 싶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는 공주 출신 선배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진로 상담을 위해 알지도 못하는 선배를 찾아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선배와의 만남 후, 결심이 선 그는 매주 서울을 오가며 영화 입시학원을 다녔다. 토요일 2교시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두 타임 수업을 듣고 숙소에서 잠을 잔 뒤, 일요일 두 타임 듣고 공주로 내려오는 생활을 1년 동안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이 넓음을 깨달았다. 보수적인 도시인 공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
대학에 들어간 그는 나름 '꽤 잘하는 학생'이었다. 학교 워크숍 작품, 선배들의 졸업 작품, 각종 독립 영화들에 스태프로 참여하며 20대 초반을 보냈다. 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후 상황이 달라졌다.
"내가 열심히 알려주고 도와주던 후배들이 저보다 더 많이 성장해 있는 걸 느꼈어요. 엄밀히 말해 그때 깨달은 것은 영화 현장에서의 제 위치였죠. 봉준호나 박찬욱 같은 이들만 예술을 하고, 저 같은 스태프들은 노동을 하는 셈이었죠."
그에게 영화는 '약속'이었다. 약속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약속된 콘티를 짜서,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사람들이, 약속된 시간에 만나서, 약속된 것들을 주고받는 행위였다. 완벽한 컷을 추구했다가 망친 경험도 있었다.
"어떤 신(scene)을 준비해 촬영하는데, 갑자기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한 컷 정도만 원래 콘티와 다르게 더 예쁘게 만들자고 고집을 부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샷만 예쁘게 나오고, 그 샷 하나 때문에 앞뒤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1천만 원으로 시작한 무모한 실험
영화에만 빠져 살던 그가 카페를 하겠다고 마음먹게 만든 계기는 어머니였다. 2015년 지금의 '반죽동247'의 전신인 '반죽동 커피공방'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