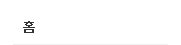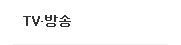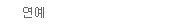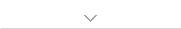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윤어게인'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된 영치금, 대통령 연봉의 2배
요 며칠 전,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영치금 현황을 다룬 한 기사를 읽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1백여 일 남짓한 동안,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일순간 '영치금'이라는 제도가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었던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밀려왔다.
영치금 제도는 본래 단순하고 소박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들이 세면도구나 편지지, 작은 간식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장치였다. 국가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형벌 속에서도 인간의 최소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 수감자라 할지라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헌법의 인간 존엄성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제도는 언제나 그 틈에서 변질된다. 선의로 만들어진 장치는 권력과 욕망의 손을 거치면 언제든 악용될 수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논란이 바로 그 사례였다. 그의 계좌에는 하루에도 수십, 많게는 백 건의 입금이 이어졌고, 180차례에 달하는 출금이 있었다고 한다. 그 돈의 총액은 대통령 연봉의 두 배 반, 국회의원 4년간의 후원금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영치금은 정치자금도, 기부금도 아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치적 후원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입금 한도도 없고, 세금 부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법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말하자면 '회색지대의 돈'이다. 기부금은 신고와 공개의 의무가 있고, 정치자금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지만, 영치금은 그 어떤 감시도 받지 않는다. 잔액이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된다면 무제한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결국 이 제도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권력자에게 또 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국정감사에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이라는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한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제도의 왜곡이며, 국가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교정제도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와 정의는 이미 균열을 맞는다.
법의 빈틈, 정의의 붕괴
법은 언제나 늦게 움직인다. 사회는 이미 변했는데,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있다. 영치금 제도도 그랬다. 원래 '수용자의 편의'라는 제한된 목적 아래 설계된 이 제도는, 지금은 정치적 후원금의 새로운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법적 측면에서 보자면, 영치금은 분명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교정시설의 금융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자료 제공 시스템이 미비하고, 입금 목적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결국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