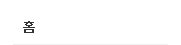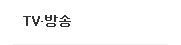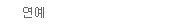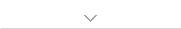지귀연의 '농담 재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법정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그곳에서는 오직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만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신성한 공간이 한 사람의 눈빛과 변호인의 표정에 따라 흔들리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의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한 나라의 법정이 한때 권력자였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재판 일정을 바꾸고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서" 일정을 취소하는 광경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이며, 법관의 중립성과 책임이 정치적 강자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다.
법원은 국민의 법정이다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심판한다. 그의 입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국민의 정의가 흘러나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지귀연 재판장은 스스로 그 자리를 방기하고 있다.
"우리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지난달 30일, 지 재판장이 추가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윤석열 변호인에게 한 말이다. 이 한마디가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그 '간절한 눈빛'은 법 앞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약자의 눈빛이 아니라, 권력과 특권으로 무장한 피고인의 오만함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 눈엔 지귀연 재판장이 법복을 벗고 권력의 시중을 드는 하인으로 보였다.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하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면, 법관은 누구보다 단호해야 한다. 그의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역사적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그가 한결같이 보여주는 태도는 '조율'이 아니라 '항복'이다. 윤석열 변호인이 "일주일에 4일은 못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다른 날짜를 하겠습니다"라며 물러서고, 논쟁이 길어지면 "변호사님들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요"라며 웃음으로 넘긴다.
국민은 알고 있다. 내란 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에서의 미소 한 번, 눈빛 한 번이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는지를. 그것은 약자에게 절망을, 그리고 정의를 믿는 이들에게 배신을 의미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