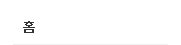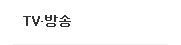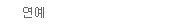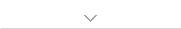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소풍 같네" 농담했지만, 두렵던 상경 버스... 계엄 1년, '뜨거운 연대'를 기억하며
12월 3일 오전, 충남 서산의 바람은 1년 전 그날처럼 날카로웠다. 옷깃을 파고드는 한기는 대한민국 헌정사가 벼랑 끝에 섰던 '12.3 비상계엄'의 서늘한 기억을 소환하기에 충분했다. 서산시청 앞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사무실 앞에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이날 서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계엄 1년 책임자 규명 기자회견'은 단순한 성토의 장이 아니었다. 혹독한 겨울을 함께 건너온 시민들이 무너질 뻔했던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버스 안 '김밥'에 섞인 두려움과 연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서산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자, 참석자들의 눈가는 이내 젖어 들었다. 기자의 뇌리에도 1년 전 주말마다 광화문으로 향하던 전세버스의 풍경이 스쳤다.
당시 서산, 태안, 당진의 시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직장인, 학생, 아이 손을 잡은 주부, 머리가 희끗한 노인까지 다양했다. 왕복 5시간이 넘는 고단한 여정 속에서 시민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었다.
버스 안에서 누군가 던진 "꼭 소풍 가는 기분이네"라는 농담 뒤에는, 군화 발에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원초적 공포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낯선 이들이 서로 눈을 맞추며 김밥과 가래떡을 나눌 때, 그 두려움은 '연대'라는 단단한 옹벽으로 바뀌었다.
광장에서 터져 나온 "탄핵 가결"의 함성, 그리고 옆 사람을 끌어안고 흘렸던 뜨거운 눈물. 이날 모인 시민들은 "그날의 눈물과 함성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유는 누군가 지켜낸 것'이라는 명제가 서산의 거리에서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결정적 순간에 지역 대표는 없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