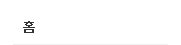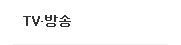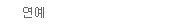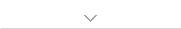옷장 속의 코스튬과 그날의 기억
션 씨는 노래를 부르고 키보드와 드럼을 연주하고 직접 가사를 쓴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기도 한다. "혹시 그날 어디에 계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션 씨와 처음 연결되었을 때, 나는 수화기 너머로 그에게 물었다. 이윽고 그가 방문했던 클럽의 상호명을 듣고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그곳에 가 본 적 있으므로. 해밀톤 호텔 옆 경사진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그 입구가 보인다.
"현장 가까이 계셨군요." 어떤 조심성이었을까. 내가 션 씨의 경험을 완곡하게 표현하자 그는 단호하게 정정했다. "아니요. 현장에 있었던 거죠." 아차. 그렇게 인터뷰 약속을 잡고 나는 그 말에 대해 한참 생각했다. 분명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생존자'라고 쉽게 묶이지만, 그 혼란한 가운데서 서로 얼마나 다른 기억을 가지는지 의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더해 참사는 개인의 삶과 뒤섞이기 마련이다. 지나온 시간 위에 놓여 해석되고, 그날 이후 겪은 무수한 사건에 간섭한다. 션 씨의 이야기는 현대사를 가로지른다. 광주와 홍콩과 세월호와 이태원이 실타래처럼 엮여 그를 관통한다.
기록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션 씨의 라이브 영상을 재생했다. 그가 참사 이후 남긴 메모를 바탕으로 가사를 쓴 곡이다. 그는 그 곡의 제목을 '천사를 위한 응급처치 책'이라고 지었다. 누구든 아끼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망자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지 않겠냐고. 그런데 천국에 간 천사들이 너무 아파 보여 응급처치가 필요할 것 같았다고. 그렇게 그는 응급처치가 될 만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들고 싶었다.
노래의 후반부에 이르자 션 씨는 절규하듯 부른다. "살자" "살자" 반복되는 그 외침은 다른 누군가를 향하기 앞서 자기 자신을 향한다. 그런 다짐과 바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온 게 참사 이후의 날들이다. 현장에서 생존한 그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분투한다.
옷장 속의 코스튬과 그날의 기억
상민: 먼저 전화로 이야기 나눈 뒤 꽤 시간이 지났네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션: 그래도 일상을 살아야 하니까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약 잘 먹고 하면서 그냥 평소랑 다름없이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민: 생각이 났다는 건 어떤 기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기억들?
션: 그날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일들이 있잖아요. 3년이나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꼬리를 물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덩어리처럼 뭉쳐져서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상민: 션 씨의 경우 다른 인터뷰이인 현민 씨를 통해 연결이 되셨죠.
션: 현민이가 제 친구예요. 현민이도 그 참사를 통해서 지인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말을 했거든요. 나도 거기 있었다고. 그러다 현민이가 3주기 추모 공연을 해 보자고 했어요. 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일 것 같다고. 그리고 호박랜턴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인터뷰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때?" 그래서 바로 문자를 드렸어요.
상민: 추모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어떠셨어요?
션: 처음에는 반반이었어요. '할 수 있나'랑 '해야겠다'. 진짜 사소한 이유 때문에 하게 됐는데 22년 10월 29일 입었던 게 강시 옷이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 옷을 계속 못 버렸어요. 처음에는 한 번밖에 안 입었으니까 반품하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반품하면 또 누군가 이걸 입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버리자니 그 옷을 다시 집어야 하고. 그래서 다음 날 포장해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옷을 입고 공연한다면 드디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