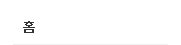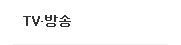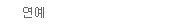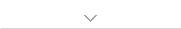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드론 사진] 강릉 오봉저수지, 목마름 드러낸 상처 난 캔버스
극한의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강릉의 식수원' 오봉저수지는 바닥의 민낯을 드러냈다. 버려진 폐광산처럼 둘러앉은 검은 띠, 아프리카의 폐광을 떠올리게 하는 어두운 물빛은 마른 상처를 감추지 못한다.
멀리서 바라보면 종이 위에 그려진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하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그 안에 응축된 깊은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저수지가 마치 캔버스와 같았다. 가느다란 붓으로 이어놓은 듯한 검은 선이 굽이치며 번지고, 몇백 미터 아래에서는 살아 숨 쉬는 용이 몸을 틀 듯 다양한 무늬가 바닥을 휘감는다. 그러나 그 안의 물길은 방향을 잃은 듯 헤매고 있다. 마치 사막을 떠도는 하이에나처럼, 저수지의 물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멀리서 바라보면 종이 위에 그려진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하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그 안에 응축된 깊은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저수지가 마치 캔버스와 같았다. 가느다란 붓으로 이어놓은 듯한 검은 선이 굽이치며 번지고, 몇백 미터 아래에서는 살아 숨 쉬는 용이 몸을 틀 듯 다양한 무늬가 바닥을 휘감는다. 그러나 그 안의 물길은 방향을 잃은 듯 헤매고 있다. 마치 사막을 떠도는 하이에나처럼, 저수지의 물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