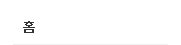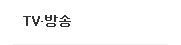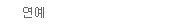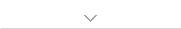30미터만 걷고 빠지더라도... 이 '달리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선 11월 29일 아침, 서울 상암동 평화공원 평화광장의 공기는 겨울 날씨라는 것을 알리는 듯 무척 매서웠다. 손발이 시렵고, 바람이 굉장히 차가운 영하에 가까운 날씨였지만, 광장 한복판은 묘한 열기로 데워지고 있었다.
새벽 6시, 7시부터 모여든 천여 명의 사람들. 그들은 화려한 러닝 기어를 갖춘 전문 마라토너들이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이들, 유모차를 타거나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 그리고 가슴에 노란 리본이나 파란 표식을 단 사람들.
이곳은 오랫동안 잊힌 참사의 피해자들과 그들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이 만나는 자리, '제1회 슬로우런(Slow Run)'의 현장이었다.
'슬로우런'. 이름부터 마라톤의 본질과 상충한다.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심장이 터질 듯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천천히 뛰거나 걷는 대회. 이것은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었다. 지난 14년간 숨 쉬는 것조차 투쟁이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한 속도전, 그리고 사회의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 만든 '가장 느린 축제'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가습기살균제피해회복대책모임'과 함께한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등은 행사를 기획하며 단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피해자가 더 이상 병상에 누워 우는 존재가 아니라, 광장으로 나와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주체가 되자"는 것이었다.
수증기를 마시며 선 출발선... "시민들과 함께 완주하려고요"
오전 9시, 출발선 맨 앞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늦게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섰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폐섬유화 환자, 기관지 협착으로 호흡 보조기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출발 10분 전, 참가자들이 몸을 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은 텐트 안에서 '가습기'와 같은 수증기가 흘러나오는 소형 흡입기를 사용하는 피해자가 보였다. 휴대용 네블라이저(전동식 의약품 흡입기)를 사용하는 피해자 김경영씨였다.
남들이 신발 끈을 조이며 근육을 풀 때, 그는 좁아진 기관지를 억지로 열어 숨 쉴 공간을 확보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라도 이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피해자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김씨에게 이번 대회는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 그는 이 날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집 거실에 러닝머신을 들여놓고 연습을 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걸음이 그에게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이었다.
"제가 오늘 시민들과 함께 완주하려고 지난 6개월간 집에서 죽어라 연습했어요. 시민들과 함께 출발선에 서려고요."
출발 총성이 울렸다. 김씨는 약속대로 힘겹게 발을 떼었다. 차가운 바람이 폐부로 들어오자 그의 이마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식은땀이 맺혔다. 이날 결승선에서 다시 만난 김씨는 완주했다는 벅찬 감동으로 환하게 웃어보였다.
전체 내용보기
새벽 6시, 7시부터 모여든 천여 명의 사람들. 그들은 화려한 러닝 기어를 갖춘 전문 마라토너들이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이들, 유모차를 타거나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 그리고 가슴에 노란 리본이나 파란 표식을 단 사람들.
이곳은 오랫동안 잊힌 참사의 피해자들과 그들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이 만나는 자리, '제1회 슬로우런(Slow Run)'의 현장이었다.
'슬로우런'. 이름부터 마라톤의 본질과 상충한다.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심장이 터질 듯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천천히 뛰거나 걷는 대회. 이것은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었다. 지난 14년간 숨 쉬는 것조차 투쟁이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한 속도전, 그리고 사회의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 만든 '가장 느린 축제'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가습기살균제피해회복대책모임'과 함께한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등은 행사를 기획하며 단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피해자가 더 이상 병상에 누워 우는 존재가 아니라, 광장으로 나와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주체가 되자"는 것이었다.
수증기를 마시며 선 출발선... "시민들과 함께 완주하려고요"
오전 9시, 출발선 맨 앞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늦게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섰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폐섬유화 환자, 기관지 협착으로 호흡 보조기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출발 10분 전, 참가자들이 몸을 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은 텐트 안에서 '가습기'와 같은 수증기가 흘러나오는 소형 흡입기를 사용하는 피해자가 보였다. 휴대용 네블라이저(전동식 의약품 흡입기)를 사용하는 피해자 김경영씨였다.
남들이 신발 끈을 조이며 근육을 풀 때, 그는 좁아진 기관지를 억지로 열어 숨 쉴 공간을 확보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라도 이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피해자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김씨에게 이번 대회는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 그는 이 날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집 거실에 러닝머신을 들여놓고 연습을 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걸음이 그에게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이었다.
"제가 오늘 시민들과 함께 완주하려고 지난 6개월간 집에서 죽어라 연습했어요. 시민들과 함께 출발선에 서려고요."
출발 총성이 울렸다. 김씨는 약속대로 힘겹게 발을 떼었다. 차가운 바람이 폐부로 들어오자 그의 이마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식은땀이 맺혔다. 이날 결승선에서 다시 만난 김씨는 완주했다는 벅찬 감동으로 환하게 웃어보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