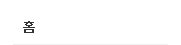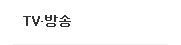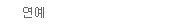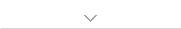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내란 1년'... 윤석열의 야만, 법꾸라지와 야당의 후안무치에 맞서는 법
내란이라는 야만의 시간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1년이 지났다. 내란의 주범들은 법정에 세워졌고, 특검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모든 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과 박근혜도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형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야만은 달랐다. 이미 탄핵 이전부터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책동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도 놀라운 일이지만, 내란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비협조와 고의적 재판 방해 행위로 마치 법 기술의 화려한 쇼를 보는 듯했다. 법원의 이해하지 못할 영장 기각도 이어졌다.
지난 1년은 마치 10년 동안 발생했을 법한 다양한 사건 이슈가 이어졌지만 무엇 하나 개운한 게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하다.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자행하는 무법국가적 현실은 차라리 경이롭기조차 하다. 이 무법의 아수라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오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불안한 정치과정을 맞고 있다. 내란의 밤 이후 1년,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다.
세 갈래의 시민주의
긴 내란 정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구를 가리던 올해 초, 새해를 맞으며 나는 우리 민주주의의 희망을 내란의 카오스에서 반짝이는 세 갈래의 시민주의에서 찾고자 했다.
첫째는 'MZ세대의 시민주의'다. MZ세대는 스펙 쌓기와 경쟁에 길든 '신자유주의의 아이들'로 여겨져왔다. 능력에 기반한 공정을 내세우는 이 세대의 가치는 오로지 자기만을 향해 있었고 역사와 공동체와 민주주의는 남의 일이었다. 서사를 잃어버린 세대이기도 했다. 바로 이 세대가 윤석열의 내란에 저항하며 빛나는 응원봉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서사를 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아이들'이 '윤석열에 대한 저항집단'으로 바뀐 놀라운 변신이야말로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둘째는 '군대의 시민주의'다. 우리 군은 정치주의와 파벌주의에 물들었던 어두운 과거를 안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이 당연시되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시민의 군대'로 거듭날 계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 긴박한 내란의 밤에 민주화 이후 우리 군에 아주 제한적이나마 내면화된 시민주의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계엄군의 시민주의가 정치군인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지연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다. 제복 입은 시민의 시민주의는 어쩌면 내란이 준 선물일지 모른다.
셋째는 '노조의 시민주의'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계급주의와 정파주의에 갇혀 시민적 연대를 확장하지 못하거나, 조직 노동의 제 식구 챙기기로 미조직 노동이나 취약계층과의 연대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의 시대인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조직 기반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노동조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조직된 시민으로 남았다. 비상계엄의 밤, 노동조합은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민첩한 동원을 시도했고 탄핵 과정에서 광장은 언제나 전국의 노동조합으로 채워졌다. 노동조합의 조직된 시민주의가 내란과 탄핵의 밤을 밝혔다.
공론장의 극단적 분열
내란의 반동과 빛의 혁명이 뒤엉킨 각축장에서 세 개의 시민주의는 빛났다. 그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는 살아났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내란 이후 1년,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무엇보다 광장의 시민이 벼랑 끝에서 지킨 민주주의에 내재한 제도적 허약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했다. 금과옥조의 명언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최후의 보루'로 그친 민주주의를 상상하진 않았으리라.
12·3 비상계엄을 국회가 막은 후 국회 정원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표지석이 놓였다. 몇 번의 정부에 걸친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벼랑 끝에서 '최후의 보루'가 지킨 '최후의 민주주의'가 되고 말았다. 광장의 시민이든 계엄군에 포위된 국회든 최후의 보루가 지킨 최후의 민주주의야말로 가늘고 위태롭게 서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언제까지 차가운 광장에 선 시민의 힘으로 지탱되어야 하나?
내란 이후 1년, 우리 민주주의는 거대한 제도적 공백을 경고하고 있다. 해방 80년, 대한민국은 성공한 민주주의의 나라로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선거판'과 '국회'와 '광장'에서만 요란하게 아우성치는 얄팍한 제도에 머물러 있다. 두터운 대화와 소통을 뒷받침하는 제도 없이 안정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최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보다 더 불안한 현실은 내란 심판 방해와 지체를 떠받치고 있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극단적 분열이다. 야당은 대놓고 윤석열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적반하장의 '법치'를 주장하는 후안무치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자신은 구치소에서 온갖 유치한 구실로 재판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의도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