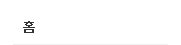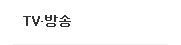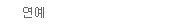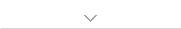세탁기가 가정 바꿨듯, 배설 자동화가 요양 돌봄 바꿀 수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가장 힘든 일은 배변 처리다. 많은 사람들은 약물 관리나 낙상 예방을 떠올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배설 관리가 보호사의 몸과 마음을 가장 크게 소모시킨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저분하다', '말하기 민망하다'는 이유로 늘 논의의 뒤편으로 밀리며, 정책과 기술 도입에서도 외면받아 왔다. 그 결과 보호사와 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채 쌓여만 갔다.
20년째 침상에 누워 있는 한 이웃의 이야기
필자가 사는 동네에는 20년 전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지금도 침상에서만 생활하는 이웃이 있다. 그는 오랜 시간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지내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정 노동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냄새를 견디며, 환자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돕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하며, 요양시설이 보호사들의 숙련된 손길과 헌신으로 겨우 버텨온 현실을 전했다.
또 "배변 처리는 대부분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부탁하는 쪽도 미안하고, 하는 분도 몸과 마음이 다 지쳐요"라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환자와 보호사 모두의 존엄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왜 이 중요한 분야에만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요양사가 가장 많은 체력을 쓰는 곳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입을 모아 "가장 힘든 일은 배변 처리"라고 말한다. 배변이 감지되면 한 명의 보호사가 씻기기, 체위 변경, 옷 갈아입히기, 침구 정리, 욕창 점검, 주변 소독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15~30분이 걸리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소진도 매우 크다. 이렇게 힘든 일을 반복하다 보면 정작 환자에게 필요한 산책 보조, 운동 지도, 말벗 서비스 같은 '사람다운 돌봄'을 제공할 여력이 남지 않는다.
전체 내용보기
그러나 이 문제는 '지저분하다', '말하기 민망하다'는 이유로 늘 논의의 뒤편으로 밀리며, 정책과 기술 도입에서도 외면받아 왔다. 그 결과 보호사와 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채 쌓여만 갔다.
20년째 침상에 누워 있는 한 이웃의 이야기
필자가 사는 동네에는 20년 전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지금도 침상에서만 생활하는 이웃이 있다. 그는 오랜 시간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지내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정 노동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냄새를 견디며, 환자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돕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하며, 요양시설이 보호사들의 숙련된 손길과 헌신으로 겨우 버텨온 현실을 전했다.
또 "배변 처리는 대부분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부탁하는 쪽도 미안하고, 하는 분도 몸과 마음이 다 지쳐요"라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환자와 보호사 모두의 존엄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왜 이 중요한 분야에만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요양사가 가장 많은 체력을 쓰는 곳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입을 모아 "가장 힘든 일은 배변 처리"라고 말한다. 배변이 감지되면 한 명의 보호사가 씻기기, 체위 변경, 옷 갈아입히기, 침구 정리, 욕창 점검, 주변 소독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15~30분이 걸리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소진도 매우 크다. 이렇게 힘든 일을 반복하다 보면 정작 환자에게 필요한 산책 보조, 운동 지도, 말벗 서비스 같은 '사람다운 돌봄'을 제공할 여력이 남지 않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