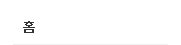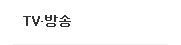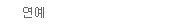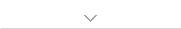달이 떠오른다, 가자… 남원, 달을 품은 마을[여행스케치]
 왼쪽에서 세 번째 기둥일 터다. 몽룡이 서쪽을 바라보며 기대어 실성한 듯 외쳐댄 곳이. “저기 저 건너 운무중(雲霧中)에 울긋불긋하고 들락날락하는 것이 사람이냐, 신선이냐? … 나 보기에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로다. 천년 묵은 불여우가 날 호리려고 왔나 보다!”(‘교주 남원고사·校註 南原古詞’, 정길수 교주, 알렙, 2024) ‘청천(晴天)에 떠 있는 송골매도 같고, 석양에 나는 물 찬 제비도 같은’ 춘향이 그네 뛰던 곳은 오작교(烏鵲橋) 곁이었을 테고.전북 남원 광한루원(廣寒樓苑)만큼 사실과 허구가 절묘하게 엮여 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장소도 별로 없을 것 같다. 광한루에 올라 춘향을 떠올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춘향은 현재의 연인일 수도 있고, 짝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첫사랑의 추억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판소리 한 마당, 소설 한 편으로 이 같은 정념을 부르기에는 역부족이다. 광한루 마루에 앉아 눈앞의 연못 연지(蓮池)를 바라보니 그건 아무래도 달(月)인 듯하다.
왼쪽에서 세 번째 기둥일 터다. 몽룡이 서쪽을 바라보며 기대어 실성한 듯 외쳐댄 곳이. “저기 저 건너 운무중(雲霧中)에 울긋불긋하고 들락날락하는 것이 사람이냐, 신선이냐? … 나 보기에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로다. 천년 묵은 불여우가 날 호리려고 왔나 보다!”(‘교주 남원고사·校註 南原古詞’, 정길수 교주, 알렙, 2024) ‘청천(晴天)에 떠 있는 송골매도 같고, 석양에 나는 물 찬 제비도 같은’ 춘향이 그네 뛰던 곳은 오작교(烏鵲橋) 곁이었을 테고.전북 남원 광한루원(廣寒樓苑)만큼 사실과 허구가 절묘하게 엮여 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장소도 별로 없을 것 같다. 광한루에 올라 춘향을 떠올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춘향은 현재의 연인일 수도 있고, 짝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첫사랑의 추억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판소리 한 마당, 소설 한 편으로 이 같은 정념을 부르기에는 역부족이다. 광한루 마루에 앉아 눈앞의 연못 연지(蓮池)를 바라보니 그건 아무래도 달(月)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