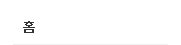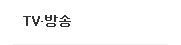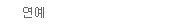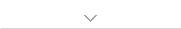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책의 향기]안개에 싸인 그림… 죽음으로 이끌거나 죽음을 애도하거나
 “광활한 죽음의 제국에 유일한 생명의 불꽃으로 있는 것. 고독한 원 안에 고독한 중심으로 세상에 놓이는 것보다 더 슬프고 불쾌한 일은 없다. (…) 이 그림은 마치 지옥의 묵시록 같다.” 19세기 독일 화가인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작품 ‘바닷가의 수도사’를 보고 한 문학가가 남긴 글이다. 이 문학가는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그는 무한히 고독하고 막막한 이 그림에 대해 “눈꺼풀이 잘려 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며 절망감을 표한다. 그리고 몇 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비슷한 시기 이 그림을 본 프로이센 왕자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그림을 보기 석 달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바닷가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홀로 선 남자를 보고 왕자는 아버지에게 “저 그림을 갖고 싶다”고 속삭인다. 왕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깜짝 놀라 그림을 산다. 바위산 정상에서 안개가 가득한 풍경을 보는 남자의 뒷모습을 그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로 유명
“광활한 죽음의 제국에 유일한 생명의 불꽃으로 있는 것. 고독한 원 안에 고독한 중심으로 세상에 놓이는 것보다 더 슬프고 불쾌한 일은 없다. (…) 이 그림은 마치 지옥의 묵시록 같다.” 19세기 독일 화가인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작품 ‘바닷가의 수도사’를 보고 한 문학가가 남긴 글이다. 이 문학가는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그는 무한히 고독하고 막막한 이 그림에 대해 “눈꺼풀이 잘려 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며 절망감을 표한다. 그리고 몇 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비슷한 시기 이 그림을 본 프로이센 왕자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그림을 보기 석 달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바닷가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홀로 선 남자를 보고 왕자는 아버지에게 “저 그림을 갖고 싶다”고 속삭인다. 왕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깜짝 놀라 그림을 산다. 바위산 정상에서 안개가 가득한 풍경을 보는 남자의 뒷모습을 그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로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