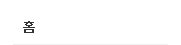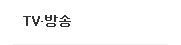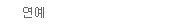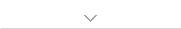'반송에 기피까지' 감정 꺼리는 감정인들…멈추는 재판
▶ 글 싣는 순서 ①"감정 지연 하세월…재판 멈췄다" 소송 당사자 '눈물'
②재판의 '병목'된 감정 지연…왜 반복되나
③'반송에 기피까지' 감정 꺼리는 감정인들…멈추는 재판
(계속)
법원 감정을 맡을 전문가를 찾지 못해 재판이 멈추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의료 감정 분야는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감정 반송'이 빈번해졌고, 이는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감정인은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전산에는 범죄경력 조회와 자격심사를 거친 감정인들이 후보로 등록돼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문가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대기업 반도체 하청업체에서 14년간 일하다 유방암 판정을 받은 A(40)씨는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여간 감정인 선정 단계에 멈춰있다. 중소 반도체 기업에서 일한 B(49)씨도 감정인 4명으로부터 반송 통지를 받았고, 7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의료 감정이 17차례까지 반송되는 사례를 봤다"며 "통계로 낼 수는 없지만 반송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감정 전문성 부족과 감정료 문제, 업무 과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의사들이 감정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토로한다.
전직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감정은 감정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의사들이 전공 과목에서도 감정을 제대로 배운 적 없으니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며 "본 업무인 환자 진료만으로도 너무 바빠, 자꾸 미루는 것도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정을 맡아도 의사가 받는 비용은 감정료의 20~50% 수준"이라며 "감정을 해도 세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환자 진료를 보는 것이 낫다는 인식도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감정 결과를 둘러싼 항의나 고소도 큰 부담이다. 감정 결과가 당사자 기대와 다를 경우,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재판 결과에 사실상 직결되기도 하다보니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감정인을 찾아와 항의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도 간혹 있다"며 "감정인들이 감정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올해 감정 촉탁 시 재판부가 반드시 당사자에게 '감정인과의 접촉 금지', '감정 결과에 대한 항의 금지'를 경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감정서에 의사의 이름이 포함되는 점도 감정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감정은 더욱 기피한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의료사고 관련 감정은 의사의 과실 여부가 핵심인데, 감정인의 이름이 문서에 그대로 들어가면 이후 항의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의사들끼리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인 경우도 있어 더 곤란해한다"고 했다.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최근에는 '기관 명의 감정'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감정서에 개인 이름을 넣지 않고 협회장 명의로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감정인의 노출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서는 감정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감정을 확대하고, 감정 절차 전반에 대한 법원과 의료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